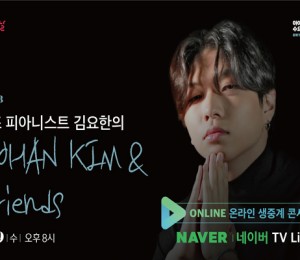꽃의 색깔은 무엇이 결정하나 - 호기심천국

- 홈지기 (114.♡.11.73)
- 08-31
- 916 회
- 0 건
자연계는 어울림 즉 조화(調和)의 미(美)가 극치를 이룬다. 뒤죽박죽 있어 보이지만 다 제 자리(位)가 있고, 차례를 지키며 질서가 있다. 꽃이 피는 것을 봐도 그렇다. 눈 속에 꽃을 피우는 설중매나 동백에서 시작하여 이른 봄에 산수유, 진달래를 피운다. 뭇꽃이 철마다 수없이 피다가 늦가을 무서리가 내릴 때면 국화가 제철을 만난다.
‘꽃’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의미를 지닌다. ‘꽃 같은 시절’이란 화려한 청춘을 의미하고, 어여쁜 여인을 ‘꽃’으로 비유하는 것도 당연지사다. 그 집안에 ‘꽃이 피었다’고 하면 역시 그 가정이 번영하고 또 영화로운 일이 생긴 것을 뜻한다.
꽃의 색깔은 크게 보아 빨강, 노랑, 파랑, 흰색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어째서 저렇게 색이 다 다르단 말인가. 꽃의 꼴도 하나같이 다 다르고 색도 같지 않으니 이를 우리는 형형색색(形形色色)이라 부른다.
붉은 봉숭아꽃을 가득 따자. 그것을 막자사발에서 콩콩 찧어 꽃국물(즙)을 짜낸다. 시험관에 그것을 쏟아 넣고 거기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본다. 갑자기 변색하는 것을 볼 것이다. 붉게 변한다. 거기에다 양잿물(수산화칼륨, KOH)을 조금 부어보자. 푸른색으로 바뀐다. 요술이 따로 없다!
꽃물이 산성에서는 붉은색으로, 알칼리성에서는 푸른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꽃물 속에 과연 어떤 물질이 있기에 이런 변화무쌍한 변덕을 부리는 것일까. 리트머스종이가 그렇지 않았던가. 맞다. 산성을 묻히면 붉은색으로, 또 알칼리성에서 푸른색을 보였다. 꽃물의 성질이 리트머스의 성질과 같다.
그러면 리트머스(litmus)는 무엇인가. 종이에다 뭘 묻혔기에 산과 알칼리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리트머스는 식물의 일종인 이끼(지의류)의 이름이다. 즉 리트머스이끼의 즙을 뽑아 걸러서 액체 그대로 쓰면 ‘리트머스액’이고, 그것을 종이에 발라 말린 것이 ‘리트머스종이’다. 봉숭아도 식물이다. 리트머스액이나 꽃물이나 다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바로 화청소(안토시아닌, anthocyanin)란 물질이 마술을 부린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붉은색 꽃은 그 꽃잎을 구성하는 세포질이 산성이란 것이다. 봄에 진달래꽃잎을 따먹어보면 신맛을 낸다. 그리고 푸른색 계통의 꽃은 세포가 알칼리성이기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세포 속의 액포(液胞)라는 작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화청소가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알칼리성에서는 푸른색을 낸다.
그렇다면 노란 꽃은 왜 노란가. 그것은 화청소와 관계가 없다. 카로티노이드(carotenoid)라는 색소가 있어서 그렇다.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는 당근이나 귤 등 황색 계통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다.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느 것이 있는가와 또 그것들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노란색의 짙은 정도가 달라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흰 꽃이다. 희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일종의 돌연변이로 그 식물은 화청소도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도 만들지 못한다. 흰 꽃잎을 따서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세게 눌러보자. 어허! 흰색조차도 없어지고 만다. 무색(無色)이란 말이 맞다. 세포에 들어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서 그렇다. 겨울에 눈을 대야에 모아보면 하얗지만 거기에 물을 부으면 역시 무색이 된다. 눈송이 틈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갔기에 그렇다. 흰 꽃이나 눈송이가 희게 보이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빛을 산란(散亂) 시키기 때문이다. 공기의 산란이 흰색을 띠게 하더라.
꽃 색을 결정하는 것은 화청소, 카로티노이드계 물질, 그리고 공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생물은 이렇게 화학과 물리(과학)를 만나 같이 살고 있는 것이다.
- 주간조선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