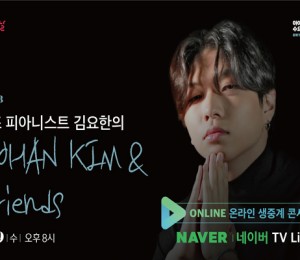추어요리 - 음식이야기

- 홈지기 (114.♡.11.73)
- 08-21
- 771 회
- 0 건
미꾸라지를 일컬어 진흙 속에 산다하여 '이추(泥鰍)',또는 가을 고기라 해서 추어(鰍魚)라고 한다. 추어는 동면(冬眠)을 위해 늦여름에서 가을까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지방이 많아져 맛이 좋아진다.
우리는 미꾸리나 미꾸라지를 모두 미꾸라지로 부르고 있으나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다르다. 미꾸라지는 일반적으로 꼬리 부분이 납작해서 '납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꾸리보다 커서 150㎜ 안팎의 것들이 많고 200㎜가 넘는 것도 흔히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미꾸리는 몸의 길이가 대부분 100~170㎜로 200㎜가 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몸은 가늘고 길며 원통형으로 '둥글이'라고도 불린다. 또 우리는 추어탕감으로 흔히 미꾸라지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히려 미꾸라지는 미꾸리보다 맛이 떨어진다.
조선 시대 한양의 '꼭지'라는 거지조직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여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한양에는 청계천 꼭지,복청교 꼭지,염천교 꼭지 등이 다리 밑에 살고 있었으며,이들 조직은 한양 포도청에서 인가하는 관인(官認) 거지 집단으로 그 우두머리를 '꼭지딴'이라 했다고 한다.
이들은 걸식을 할 때 밥만 빌고 건건이(반찬)를 빌면 안된다는 철칙이 있어 꼭지 일부가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여 걸식해온 밥과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이 추어탕이 '꼭지딴 추어탕' 또는 '꼭지딴 해장국'으로 장안에 소문난 명물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옛날 농촌에서는 동네 청년들이 가을걷이를 하고 나면 논에서 물을 빼고 논 둘레에 도랑을 파는 '도구'를 친다. 이 '도구'를 치면 진흙 속에서 겨울잠을 자려고 논바닥으로 헤집고 들어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미꾸리를 잔뜩 잡을 수가 있다.
이 미꾸리를 잡아 추어탕을 끓여서 여름 동안 더위에 지친 동네 노인들을 모셔 놓고 '갚을 턱' 또는 '상치(尙齒:노인을 숭상한다는 뜻)마당'이라는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
추어탕은 지방에 따라 끓이는 방법이 다르다. 미꾸리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서울식을 추탕이라 하고 미꾸리를 삶아 으깨어 끓이는 것을 추어탕이라 한다. 서울식 추탕은 미리 곱창이나 사골을 삶아 낸 국물에 두부,버섯,호박,파,마늘 등을 넣어 끓이다가 고춧가루를 풀고 미리 통째로 삶아 놓은 미꾸리를 넣어 끓인다. 반면 경상도식은 미꾸리를 삶아 으깨어 데친 풋배추,고사리,토란대,숙주나물,파,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나중에 홍·청고추를 넣어 끓인 다음 불을 끄고 방아 잎을 넣은 뒤 먹을 때 초피 가루(산초)를 쳐서 먹는다.
전라도식은 미꾸리를 삶아 으깨 넣은 후 고사리와 토란대,된장과 들깨 즙을 넣어 걸쭉하게 끓이다가 초피 가루를 넣어 매운맛을 낸다.
- 부산일보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