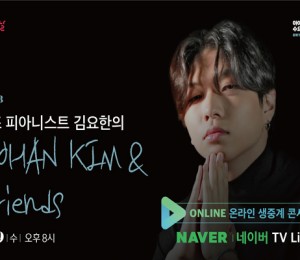차례와 다식 - 음식이야기

- 홈지기 (114.♡.11.73)
- 08-21
- 750 회
- 0 건
우리는 송편을 곱게 빚어 햇과일과 함께 차려 놓고 추석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라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매달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명절날,조상 생일 등 낮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면 '찻잎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차례에 관련한 최초의 우리 문헌이 되는 셈이다. 불전(佛前)이나 임금에게 헌다(獻茶)하던 귀한 차를 조상에게 올리는 것이 바로 차례다.
이러한 가례(家禮)때는 점다(點茶)라 하여 가루 차를 만들어 제사를 지낸 후 제사상에 올려졌던 가루 차를 잔 속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솔로 휘휘 저어 제사에 참여했던 자손들이 돌려 가며 마시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음복(飮福)이라 한다. 헌다의 풍습은 차 가루로 빚은 다병(茶餠),즉 다식을 만들어 올리는 풍습으로 이어졌고 제사를 지낸 후 제사상에 올려졌던 다식을 자손들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음복을 대신했다.
중국 송나라 때 정공언(丁公言)이라는 사람이 '용단(龍團)'이라는 이름의 다병을 처음 만들었고,당시의 명필이었던 채군모라는 사람이 이 용단이라는 다식을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면서 다식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다식을 임금에게 바칠 때 황제를 상징하는 용(龍)과 봉(鳳)을 앞뒤로 새겨 '용봉단(龍鳳團)'이라 이름하여 바쳤다. 지금도 중국의 푸젠 건주라고 하는 도시의 특산물 중에 '정채'라는 다병이 있는데 이 정채는 바로 정공언과 채군모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 다식을 우리는 차례 때만 만들어 먹었던 것이 아니라 길사(吉事)나 가정의 상비약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병을 얻었을 때 쓰기도 했다. 수,복,강,령(壽,福,康,寧)자를 넣어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다식을 혼례상,회갑상 등에 올리기도 했고,흑임자다식을 만들어 두었다가 식중독이나 토사곽란이 났을 때 복용하게 했으며,도토리다식은 창자를 튼튼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한다고 하여 '기침막이 떡'이라고도 했다.
한편 옛날에는 양반네들이 첩을 두고 살았는데,안방마님들은 투정을 없애기 위해 율무,천문동,수수,찹쌀을 섞어 성욕을 감퇴시키는 시앗 다식을 만들어 먹고 음욕을 다스렸다. 반면에 신혼부부들은 화합을 위해 꾀꼬리 다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다식을 다양한 용도와 의미를 가진 귀한 음식으로 여겼고,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다섯 가지 오방색(五方色)을 기본으로 식물이 지닌 천연색을 얻어 다식을 빚었다. 재료 역시 곡분 과일 채소 육류해산물 등 다양하다.
올해 한가위 차례 때는 다식을 조상의 차례 상에 올려 그야말로 차례다운 차례를 지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부산일보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